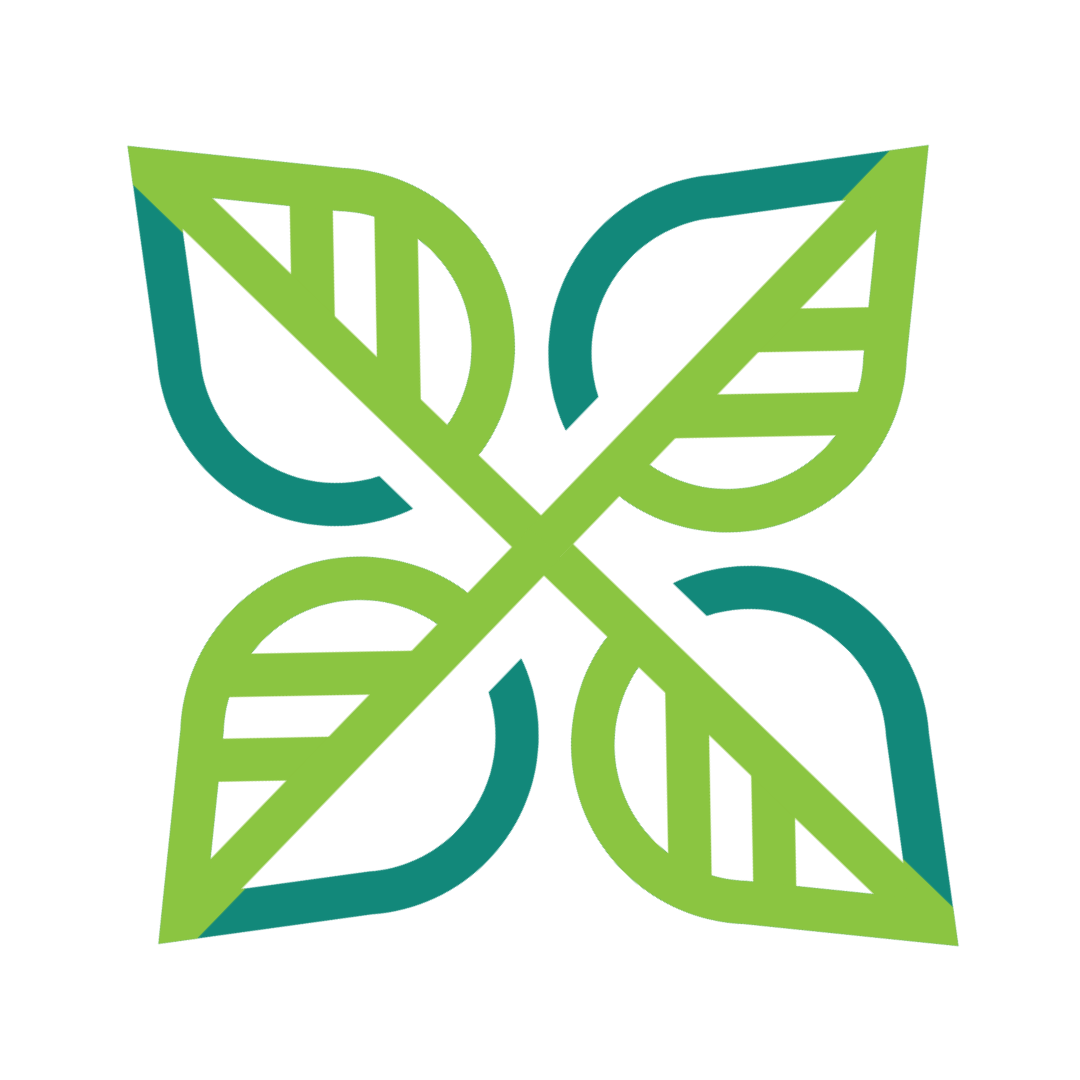-
목차

1. 삶을 결정짓는 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시간’이다
우리는 흔히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구성한다. 출근 시간, 업무 일정, 회의와 마감 등은 모두 촘촘하게 짜여 있고, 이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집중력, 감정 안정, 건강, 인간관계, 창의성은 모두 ‘일하지 않는 시간’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시간을 단순한 ‘휴식’으로만 여긴다면,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며 다음 날의 피로만 누적된다. 반면, 의도적으로 설계된 일하지 않는 시간은 회복뿐 아니라 삶의 방향성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여백이 된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일 밖에서의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회복시키느냐다. 결국 삶은 일과 일 사이의 틈에서 정해진다.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지 일정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2. 대부분의 번아웃은 ‘일의 양’보다 ‘비워진 시간의 질’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종종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쳤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의 양보다 회복 시간의 질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이 차이는 ‘일을 마친 후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도 계속 이메일을 확인하고, SNS를 보며 감정적으로 자극받고, 불규칙하게 먹고 자는 패턴은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소모다. 이처럼 일하지 않는 시간도 소극적으로 흘려보내면, 결국 삶 전체가 피로와 무기력에 잠식당한다. 우리가 회복된다고 느끼는 순간은, 단지 쉰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의식적’이었는가에 달려 있다.
어떤 이는 2시간 유튜브를 보고 나서 더 피곤함을 느끼고, 또 다른 이는 20분 산책 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한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 가다. 이 감각이 없으면 시간의 주도권은 외부 자극에게 계속 빼앗기게 된다.
3. ‘비워진 시간’은 의도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일하지 않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휴식이 되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스트리밍, 무의식적 탐색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일정처럼 디자인하고 설정해야 한다.
예: 퇴근 후 7시부터 9시까지는 휴대폰 비사용, 산책 20분, 독서 30분, 자유 기록 10분, 고요한 음악 감상 30분이라는 루틴을 만들어두는 식이다. 이런 설계는 단순히 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떤 감정 상태로 머물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 몸을 쉬게 하고 싶은가? 감정을 정리하고 싶은가? 창의적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싶은가? 목적을 명확히 하면, 그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요한 집중 상태’를 만들고 싶다면, 30분 명상이나 조용한 공간에서의 몰입 독서가 적절하다. 핵심은 의식적인 구조화다.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하지만 구조화된 시간은 기억되고, 회복을 만들어내며, 삶의 밀도를 높인다.
4. 일하지 않는 시간은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워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려면, 그 시간을 기능별로 나누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서 회복형 시간이다. 하루 동안의 긴장, 감정 소모를 해소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시간으로, 산책, 명상, 가벼운 운동, 반신욕, 향초 켜기 등 감각을 회복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인지 전환형 시간이다. 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 창의적 자극을 주는 시간이다. 독서, 강의 듣기, 다큐 감상, 글쓰기 등 뇌의 다른 부위를 자극하는 활동이 해당된다.
셋째는 관계 회복형 시간이다.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 저녁 식사, 감사 표현, 마음 나누기 등 사회적 유대와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는 활동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을 고루 배분하면, 일하지 않는 시간이 단지 ‘쉬는 시간’을 넘어서 삶을 정리하고 리셋하는 에너지 루틴이 된다. 그리고 이 루틴이 꾸준히 유지될 때, 일하는 시간에도 집중력과 창의성이 살아난다. 결국 우리가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일 밖의 시간이 먼저 살아 있어야 한다.
5. ‘삶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루틴을 만들자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설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상에 스며드는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루틴’을 정해보자. 저녁 9시 이후는 스마트폰을 끄고, 10분 정도 오늘의 감정 상태를 일기 형식으로 적고, 그날 자신에게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 적은 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침대에 눕는 방식이다.
이처럼 ‘일하지 않는 시간’을 ‘삶의 중심 루틴’으로 격상시키면, 그 시간이 단지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핵심 자원이 된다. 또는 일요일 오전에는 카페에서 혼자만의 성찰 시간을 보내는 ‘마음 정리 시간’을 습관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양보다 리듬감이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는 감정과 에너지 상태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무너졌을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거점이 되어준다. 결국 자기 계발은 시간 확보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구조화되면,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6. 시간의 주도권은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를 결정하는 힘이다
결국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건, ‘내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를 넘어,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는가’를 인식하는 힘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중심을 잡는다. 일에 쏟는 시간은 사회가 정한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 즉 ‘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글을 쓰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산책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런 시간들이야말로 내면의 지도를 그리고, 나다운 리듬을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결국 일할 때의 나를 규정한다.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먼저 ‘비워진 시간’을 설계하고, 그 안에 자신을 초대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기계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감정기록법: 하루 5줄 마음 관찰 일기 실천법 (0) 2025.04.19 불안과 초조함을 이기는 루틴의 힘 (0) 2025.04.19 디지털습관 리셋 챌린지: 스마트폰 덜 보게 되는 실천 전략 (0) 2025.04.18 내면의 회의감 다루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감정관리 (0) 2025.04.18 잠재력 확장: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실험들 (0) 2025.04.18
네그루의 블로그
네그루의 성장일기를 그린 블로그입니다.